임권택 "부산영화제 최고 만든 건 자율성, 그걸 잊지 말아야"
영화인·전문가 조언김동호 "칸의 저력은 간섭 않는 것"민병록 "부산시 양보, 민간에 맡겨라"김의석 "영화계·부산시 모두의 재산"중앙일보 나원정 입력 2016.04.26. 01:00 수정 2016.04.26. 06:26
“올해 영화제 열리나요?” 요즘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2014년 세월호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에 대한 부산시의 상영 철회 요구를 BIFF가 거부하면서 시작된 갈등은, 영화제 개막을 5개월 앞둔 지금까지 악화일로다. 영화인들의 보이콧 선언과 부산시의 독단적 개최 방침이 맞서는 가운데 상영작 수급 등에도 빨간 불이 켜진 상황. ‘표현의 자유’ 문제에 정치적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BIFF 사태는 대립은 있되 타협은 없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드러내는 사안으로 비화했다. 남은 쟁점과 해법은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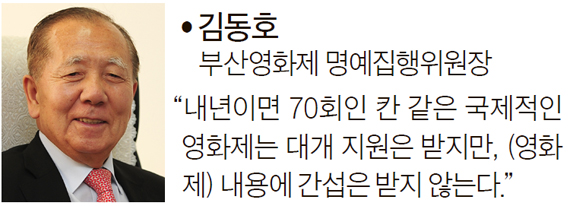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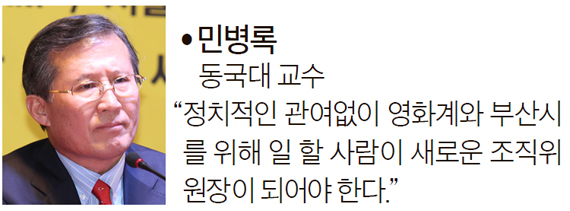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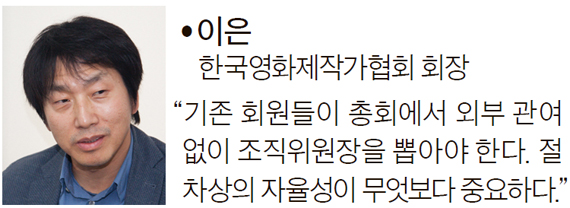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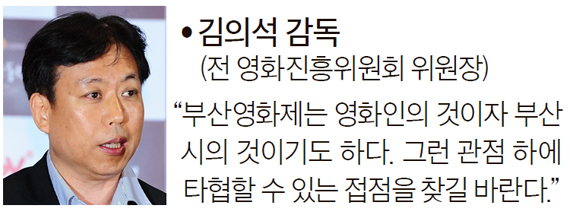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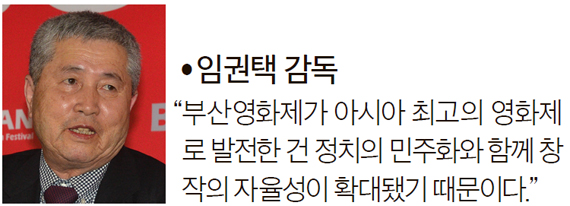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지금껏 부산시장이 맡아왔던 조직위원장 인선이다. 지난 2월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재선임하지 않기로 하면서, 스스로 조직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직위원장 민간 이양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 당연직인 조직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기 위한 정관 개정 문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영화인이 맡는 집행위원장은 강수연이다).
| 김동호, 조직위원장 추대설 부인
영화계선 양측 중재할 카드로 기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민간 이양’을 강조했다. 김동호 BIFF 명예집행위원장은 “세계적 영화제들은 지원은 받지만 간섭은 받지 않는다”며 “부산시가 장악하려 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 민간에 맡기라”고 권고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지낸 민병록 동국대 교수는 “한국영화가 BIFF를 통해 어떻게 발전했는지 무시한 채 정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문제”라며 “일단 부산시가 양보하라”고 했다. “부산시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 영화인들이 민주적으로 조직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안정숙 인디스페이스관장), “누가 조직위원장에 추대되느냐 보다 절차상의 자율성이 더 중요하다”(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영화진흥위원장을 지낸 김의석 감독은 “영화제는 영화인의 것만도, 부산시의 것만도 아니라”며 “그런 관점에서 타협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세비로 운영되는 만큼 ‘지분’을 요구하는 시의 입장도 고려하는 것이 사태 해결을 돕는다는 것이다. 한 영화계 인사도 “양쪽 수뇌부의 감정싸움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 주유신 부산영화학과교수협의회장(영산대 교수)는 “BIFF가 국가적 브랜드인 만큼 국비 지원을 늘려 시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부산시에 의해 새로운 조직위원장 추대 논의가 나온 김동호 위원장은 “부산시에 공식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김의석 전 영진위원장은 “신망이 두터운 영화제 전문가”라며 환영했다. 반면 한 영화학과 교수는 “김위원장의 역량과 무관하게 새로운 20년을 모색하는 시점에 원로인 김위원장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갈등이 계속되며 영화제의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다. BIFF의 한 해 예산은 120억 원. 이 중 부산시비 60억 원과 국고 지원, 영화제 기간 티켓 수입을 제외하고 40억 원 안팎의 예산은 스폰서 협찬으로 해결한다. 홍효숙 BIFF 프로그래머는 “이쯤이면 스폰서 업체가 50~60%는 결정돼야 하는데, 올해는 아직 한 건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아시아 신인 감독 발굴·제작지원 프로젝트 아시아영화펀드(ACF) 등도 덩달아 차질을 빚고 있다.
임권택 감독은 “한국 영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BIFF가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한 건 민주화와 함께 창작의 자율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 영화제와 부산시가 쌓인 갈등을 풀고, 영화제가 잘 됐던 시기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